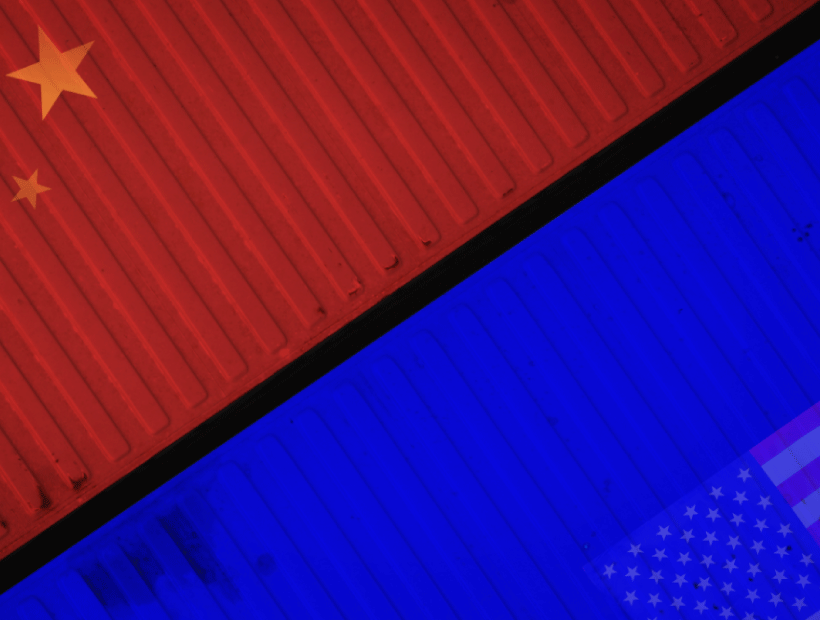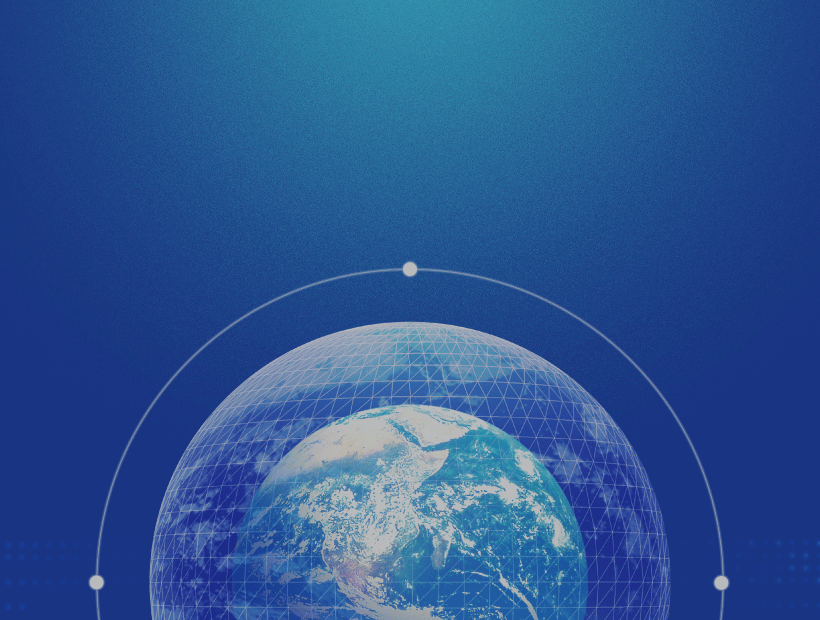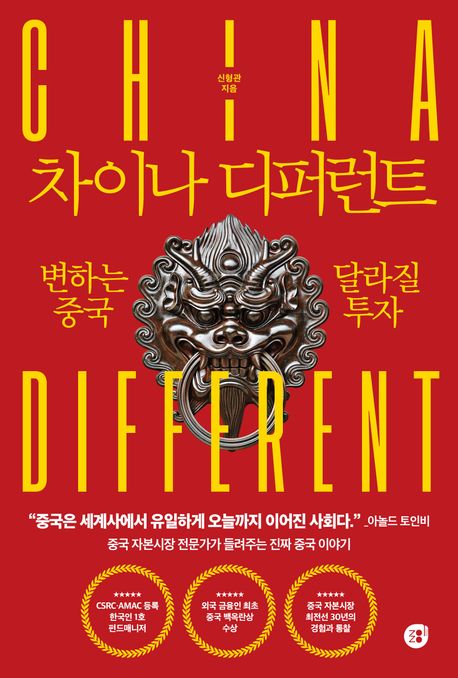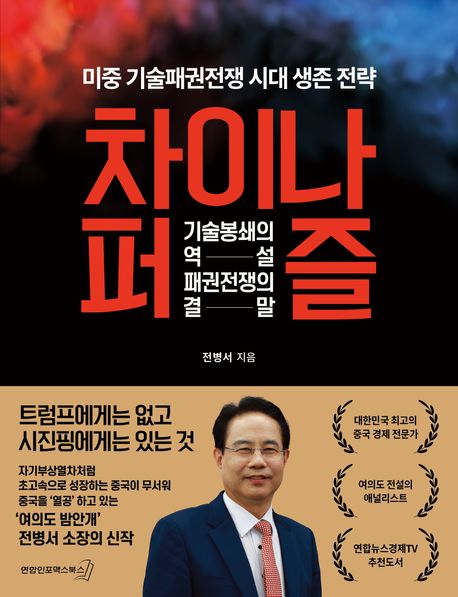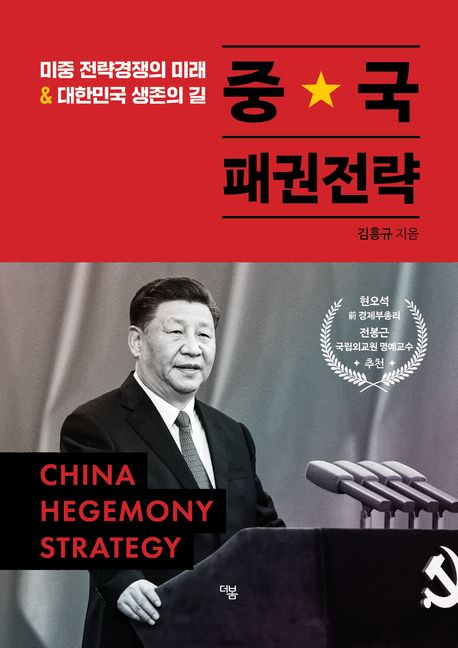-
미국–대만: 전략적 혼란의 시대
“미국–대만: 전략적 혼란의 시대” “États-Unis/Taïwan : le temps de la confusion stratégique” 저자 Charles-Emmanuel Detry 발행기관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 l’Institut français des relations internationales) 발행일 2025년 10월 8일 출처 바로가기 프랑스 국제관계연구소(IFRI)가 10월 8일 발표한 「États-Unis/Taïwan : le temps de la confusion stratégique」는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대만정책이 기존의 ‘전략적 모호성(ambiguïté stratégique)’을 넘어 ‘전략적 혼란(confusion stratégique)’의 시대로 접어들었다고 진단한다. 보고서는 미국의 일관된 대외 전략이 붕괴하면서 대만 문제가 더 이상 억지의 영역이 아닌, 오판과 불확실성의 영역으로 변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보고서는 먼저 트럼프의 재집권이 동맹 경시와 보호무역 강화로 나타나는 가운데, 대만 문제에서 상반된 해석이 존재함을 지적한다. 하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포기하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대만 방어를 유지할 것이라는 ‘리버스 닉슨(reverse Nixon)’ 시나리오이고, 다른 하나는 트럼프가 러시아·중국과의 3극 협상을 통해 대만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삼두(三頭) 분할(triplice)’ 시나리오다. 그러나 저자는 두 시나리오 모두 과장된 해석이라며, 트럼프의 외교정책에는 전략적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실제로는 즉흥적 이해득실 계산에 따라 움직인다고 평가한다. 이런 불안정한 외교 태도가 중국의 오판 가능성을 높여 대만해협의 긴장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수십 년간 유지해온 ‘하나의 중국’ 원칙과 「대만관계법」(TRA), 그리고 ‘6대 보장’이라는 제도적 틀을 검토하면서, 이러한 법적 기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식 ‘자국우선주의(America First)’와 행정부 내부의 분열이 그 효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대만산 제품에 32%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면서도, 동시에 대만을 ‘국가’로 표기하는 등 모순된 신호를 보냈다. 이는 중국에 대한 도발로 해석되는 한편, 대만에게는 미국의 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을 심어주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일치가 억지력(deterrence)을 훼손한다고 경고한다. 중국은 미국의 불명확한 태도를 ‘약화된 의지’로 오해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무력시위나 압박전술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군사적 대응 의지가 여전히 존재하더라도, 그 신호가 혼란스럽게 전달될 경우 충돌 위험은 커진다는 것이다. 한편 보고서는 대만이 반도체 산업을 통해 형성한 ‘실리콘 방패(silicon shield)’ 개념에도 주목한다. TSMC는 세계 최첨단 반도체 생산의 90%를 차지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대만의 전략적 가치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미국 내 생산 다변화와 ‘CHIPS법’에 따른 지원정책이 진행되면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기조는 이 방패의 효과를 약화시킬 수 있다. 대만의 기술적 우위가 유지되더라도, 미국 내 정치 변화와 공급망 재편은 장기적으로 대만의 ‘억지 기반’을 흔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오늘날 미국이 냉전 이후 처음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중국만큼 분명히 알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 있다고 평가한다. 이러한 전략적 혼란은 중국의 계산착오를 부추기고, 대만의 생존전략을 더 불안정하게 만든다. 보고서는 전쟁이 ‘임박’하지는 않았지만, 그 가능성이 “덜 불가능(less unlikely)”해진 현실을 경고하며, 미국의 정책적 명료성 회복이야말로 대만과 동아시아 안정의 관건이라고 결론짓는다.
-
출산이 국가의 의무가 될 때: 인구 감소를 되돌리려는 중국의 고군분투
“출산이 국가의 의무가 될 때: 인구 감소를 되돌리려는 중국의 고군분투” “When giving birth is a national duty: Beijing’s struggle to reverse demographic decline” 저자 Daria Impiombato, Nis Grünberg 발행기관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 Mercator Institute for China Studies) 발행일 2025년 10월 8일 출처 바로가기 독일 메르카토르 중국연구소(MERICS)가 10월 8일 발표한 「When Giving Birth is a National Duty: Beijing’s Struggle to Reverse Demographic Decline」은 중국의 급격한 인구 감소와 정부의 대응 정책을 분석하면서, 출산 장려 정책이 어떻게 여성의 권리를 제약하고 당국의 통제 강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비판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중국의 인구 문제는 출산율 저하(2022년 1.09명), 급속한 고령화(65세 이상 15.4%)와 노동력 감소(15–59세 62.6%)로 특징지어진다. “부유해지기 전에 늙는 사회”가 될 위험이 커지면서, 시진핑 지도부는 출산 억제에서 출산 장려로 방향을 전환했다. 이는 경제 성장과 국가안보의 핵심 과제로 간주되며, 인구정책이 국가전략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한 자녀 정책’의 유산을 뒤집으려는 과정에서 구조적 제약과 사회적 저항에 직면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강제 낙태·불임수술, 남아선호로 인한 성비 불균형, 출산 관련 통제의 관료제적 잔재 등은 현재의 출산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내기 어렵게 만든 요인이다. 젊은 세대 여성들은 소가족 가치관이 내면화되어 있으며, 많은 이들이 결혼과 출산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출산을 ‘국가의 생존과 발전에 관한 대사(大事)’로 규정하고, 여성의 몸을 정책적 도구로 삼고 있다. 2021년 개정된 「인구와 가족계획법」은 ‘가정은 사회의 세포이며, 여성은 출산·양육의 자연적 역할을 가진다’고 명시하였다. 동시에 여성의 적정 결혼·출산 연령(23~28세)을 국가가 규정하고, 단일 여성의 난자 냉동이나 동성 커플의 생식의료 접근을 금지하고 있다.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2025년 3월 ‘고품질 인구발전 연구과제’를 공모하며, 출산을 인구안보와 연계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러한 접근은 여성의 자율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출산을 ‘통제 가능한 변수’로 간주하는 국가적 시각을 반영한다. 2025년 7월 발표된 「육아보조금 제도 시행방안」은 3세 미만 아동 1인당 연 3,600위안(약 72만 원)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아이 한 명을 키우는 평균비용(약 2만 6,944위안)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며, 지방정부 간 보조금 격차도 크다. 일부 지방에서는 보조금 외에도 결혼 장려금, 출산휴가 확대, 주택 보조 등을 시행하고 있으나 효과는 제한적이다. 예를 들어, 쓰촨성 판즈화(攀枝花)는 조기 보조금 정책으로 단기간 출산률이 증가했으나, 다른 지역에서는 ‘결혼 회피’와 ‘비혼 증가’ 현상이 더욱 뚜렷해졌다. 2024년 결혼 건수는 610만 건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고, 혼인율 하락은 출산 감소로 직결되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결혼과 출산을 ‘애국적 의무’로 재정의하며, 집단결혼식, 결혼·가정교육 과목 개설, ‘좋은 결혼문화’ 운동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여성들은 온라인에서 “한때는 강제 낙태, 이제는 출산 압박”이라며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무자녀세(No Child Tax)’ 제안은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SNS에서는 “출산은 개인의 권리이지 국가의 임무가 아니다”라는 목소리가 확산되었다. 여성의 출산 회피는 단순한 가치관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양육비 부담은 미국·일본보다 높으며,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는 고용차별로 이어진다. 기업은 출산휴가 인건비(약 3만~9만 위안)를 부담해야 하므로, 채용 단계에서 가임여성을 기피하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은 낮은 임금과 불안정 고용(마마강, 妈妈岗: 시간제 육아직)에 내몰리고 있으며, 비혼·비출산 여성은 사회적으로 낙인화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일련의 정책이 여성의 권리 후퇴를 초래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출산장려정책은 단기적으로 출산율을 높이지 못할 뿐 아니라, 오히려 사회적 불신과 젠더 갈등을 심화시킬 위험이 있다. 베이징은 출산을 ‘국가안보’의 일부로 규정하며 정책적 압박을 강화하고 있지만, 시민의 자발적 협조는 얻기 어렵다. 만약 출산이 ‘안보 위기’로 간주된다면, 당국은 더욱 강압적인 조치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MERICS는 “중국 공산당이 여전히 인구문제를 기술관료적 시각에서 다루고 있으며, 성평등·노동권·사회복지와 같은 근본적 요인을 외면하고 있다”고 결론짓는다. 따라서 현행 정책은 ‘너무 늦고, 너무 적으며’, 향후 수십 년간 중국의 인구 감소와 사회 불균형은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무역질서의 재편
“트럼프 2기의 관세정책과 글로벌 무역질서의 재편” “Tracking Trump’s Tariffs and Other Trade Actions” 저자 Joshua P. Meltzer & Dozie Ezi-Ashi 발행기관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 발행일 2025년 10월 2일 출처 바로가기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Brookings Institution)가 10월 2일 발표한 「Tracking Trump’s Tariffs and Other Trade Actions」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2025년 들어 단행한 대규모 관세 인상과 그로 인한 글로벌 무역 질서의 재편 현황을 분석한다. 보고서는 2025년 1월 이후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교역 파트너를 상대로 실시한 일련의 관세 조치를 “전면적 무역 재구성(global trade reset)”으로 규정하면서, 이는 단순한 보호무역이 아니라 미국 중심의 ‘신규 무역질서’ 구축 시도의 일환이라고 평가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2025년 2월부터 9월까지 총 여섯 차례에 걸쳐 주요 품목에 관세를 인상하였다. 주요 조치는 다음과 같다. (1) 철강·알루미늄에 25% 추가관세, (2) 자동차 및 부품에 25%, (3) 비(非)USMCA 인증 수입품에 10%, (4) 구리(copper)에 50%, (5) 전 세계 수입품에 대한 10% ‘보편관세(universal tariff)’ 부과, (6) 인도 수입품에 25%의 보복관세 부과 등이 포함된다. 또한 미국은 7월 베트남·일본·필리핀·인도네시아·EU·한국과의 ‘부분적 무역합의(sectoral trade deals)’를 통해 일부 관세를 유예하거나 감면하였으나, 대중(對中) 및 대북미주(對北美) 무역에서는 여전히 고율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특히 캐나다와 멕시코산 제품 중 USMCA 규정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관세를 부과하고, 나머지 품목은 예외로 하는 차별적 구조를 도입하였다. 브루킹스는 이를 “협정 기반 무역질서에 대한 새로운 압박수단”으로 평가하면서, 미국이 사실상 USMCA를 자국 중심으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국에 대해서는 “해방의 날(Liberation Day)”이라는 명칭 아래 일시적 관세 유예 조치를 발표했으나, 이후 철강·자동차 등 주요 품목에 대해 25%의 고율관세를 재개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관세정책의 결과로 2025년 미국의 교역가중 평균관세율(trade-weighted average tariff rate)이 전 세계 평균의 2배 수준으로 상승했음을 보여준다. 특히 캐나다·멕시코·중국·EU 모두에서 보복관세가 이어지며, 글로벌 교역망의 불확실성이 급격히 확대되었다. 그러나 저자들은 이번 관세정책이 단순히 ‘보호무역주의’로 규정되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은 이를 “경제안보 강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공급망 재편·리쇼어링(reshoring)·핵심 광물 확보·중국 기술의존 축소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고서는 미국의 무역조치가 2025년 들어 ‘지속적 협상 압박전략’으로 전환되었음을 강조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상시적 협상 카드로 사용하며, ‘관세 인상 → 양자협상 → 관세 유예’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자무역체제(WTO)보다 양자협상에 의존하는 ‘협정형 보호주의(agreement-based protectionism)’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브루킹스 연구진은 이러한 조치가 단기적으로는 미국 산업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세 가지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한다. 첫째, 무역 파트너국의 보복관세 확대에 따라 미국 제조업의 공급망 비용이 상승할 가능성. 둘째, 중소기업과 소비자 부담 증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압력. 셋째, 미국의 규범적 리더십 약화로 인한 글로벌 무역거버넌스 붕괴 위험이다. 특히 캐나다·멕시코와의 긴밀한 제조업 연계(특히 자동차 산업)에서 이미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USMCA의 공동검토 절차가 새로운 긴장의 초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트럼프 2기의 무역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표면적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미국의 대외신뢰와 경제적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평가한다. 저자 Meltzer와 Ezi-Ashi는 “미국은 스스로 만든 규칙(rule-based system)을 다시 거래(deal-based system)로 대체하고 있다”며, 이러한 전환이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을 구조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한다.
-
부유층 2세대의 시대, 불평등의 세습-푸얼다이와 중국의 미래
“부유층 2세대의 시대, 불평등의 세습-푸얼다이와 중국의 미래” “Fuerdai: China’s Second Generation of Wealth and Power” 저자 John Osburg 발행기관 아시아 소사이어티 정책 연구소(The Asia Society Policy Institute) 발행일 2025년 10월 1일 출처 바로가기 아시아소사이어티 정책연구소가 10월 1일 발표한 「Fuerdai: China’s Second Generation of Wealth and Power」는 중국의 ‘부유층 2세대(富二代, fuerdai)’와 ‘관료 2세대(官二代, guanerdai)’ 현상을 사회적 불평등, 세대 갈등, 엘리트 교육, 그리고 중국의 미래 권력승계 구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있다. 보고서는 먼저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와 청년실업 심화 속에서 사회적 불만이 부유층 자녀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개혁개방 초기에는 사회이동성이 높아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강했지만, 오늘날 중국 청년층은 성공이 노력보다는 ‘연줄(關係, guanxi)’과 ‘가정배경’에 달려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특히 부유층이나 관료층의 자녀들은 부모의 인맥과 자산 덕분에 명문대학 진학, 좋은 직장 취업, 그리고 사회적 지위를 손쉽게 얻는 존재로 여겨지며, 이들에 대한 반감은 “아버지에 의존하는 시대(拼爹的时代)”라는 냉소적 표현으로 상징되고 있다. 부유층 2세대(푸얼다이)의 과시적 소비와 특권의식은 2010년대 이후 SNS와 인터넷 포럼을 통해 대중의 분노를 자극했다. 일부 푸얼다이들은 고급차, 명품, 사치스러운 여행 사진을 공개하며 ‘계급적 불평등’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부동산 재벌 왕젠린의 아들 왕쓰충이 반려견에게 1만 4천 달러짜리 금색 애플워치를 착용시킨 사건은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이에 따라 국가언론은 부유층 자녀들의 ‘책임 있는 모범 사례’를 소개하며 ‘반부자 정서(anti-rich sentiment)’를 완화하려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근본적 불평등 구조를 가리기 위한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저자는 평가한다. 또한, 관료 2세대(관얼다이)에 대한 분노 역시 깊게 뿌리내려 있다. 1980년대 개혁 초기에 이들은 이중가격제의 허점을 이용해 특혜를 누렸고, 이후 인터넷 시대에 들어서면서 각종 비리와 특권 남용 사례가 대중의 분노를 촉발했다. 2010년 “내 아버지는 리강이다(My father is Li Gang)”라는 표현이 등장한 사건처럼, 권력층 자녀의 오만함은 ‘법 위의 사람들’이라는 인식을 강화시켰다. 최근에도 명문 의대 출신의 관얼다이가 병원 내 스캔들에 연루되면서 “특권층만을 위한 인턴십과 채용시장”이라는 비판이 재점화되었다. 교육 측면에서 보고서는 해외 유학이 중국 엘리트 계층의 정체성과 가치관에 복합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한다. 많은 푸얼다이들이 미국과 영국 등에서 고등교육을 받았지만, 서구에서 체득한 ‘워크라이프 밸런스’나 ‘개인주의적 가치’는 중국식 비즈니스 환경에 적응하기 어렵게 만들기도 했다. 부모 세대는 그들의 자녀가 “중국적 방식의 관계 형성 능력(guanxi)”을 잃었다고 우려하며, 일부는 자녀를 일찍 해외로 보내는 것을 ‘가족 자산 해외이전 및 장기 이민 계획’의 일환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학 경험은 엘리트 청년들의 세계관을 확장시켜, 그들이 중국 사회를 ‘비교의 렌즈’를 통해 바라보도록 만들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해외 유학생들이 경험한 차별과, 중국 내 여론의 적대적 반응은 그들로 하여금 당국의 통치능력과 사회적 신뢰에 의문을 품게 한 계기가 되었다. 한편, 보고서는 부유층 2세대의 결혼과 상속이 중국의 불평등을 더욱 고착화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중국은 상속세가 없고 부동산 보유에 대한 과세도 미비하기 때문에, 향후 수십 년간 약 1조 1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이 부유층 자녀에게 세습될 전망이다. 이들은 같은 계층 내에서만 결혼하고, 회원제 골프클럽이나 고급 네트워크 모임을 통해 폐쇄적인 사교문화를 형성하며, 점차 ‘신귀족층(new aristocracy)’으로 분화하고 있다. 반면 일반 청년층은 과잉경쟁과 기회 불평등 속에서 ‘내권(內卷, involution)’과 ‘탕핑(躺平, 누워있기)’으로 대표되는 체념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불평등 구조가 시진핑 정부의 ‘공동부유(共同富裕)’ 담론과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정부는 근면과 혁신을 강조하지만, 실제로 중국 사회에서 성공의 상징은 부모의 부와 인맥을 세습한 푸얼다이들이다. 결국 “노력과 능력이 성공을 보장하던 시대”는 끝났으며, 사회적 이동성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저자는 푸얼다이 세대가 중국 역사상 가장 교육수준이 높고 세계화된 엘리트 세대이지만, 그들이 상속받을 것은 단순한 부가 아니라 “극도로 계층화된 사회구조”라고 지적한다. 중국 정부가 사회적 불평등과 계층 고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미래의 지도층은 ‘국제적 시야’를 가진 동시에 ‘사회적 불신’과 ‘도덕적 회의’를 내면화한 세대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였다.